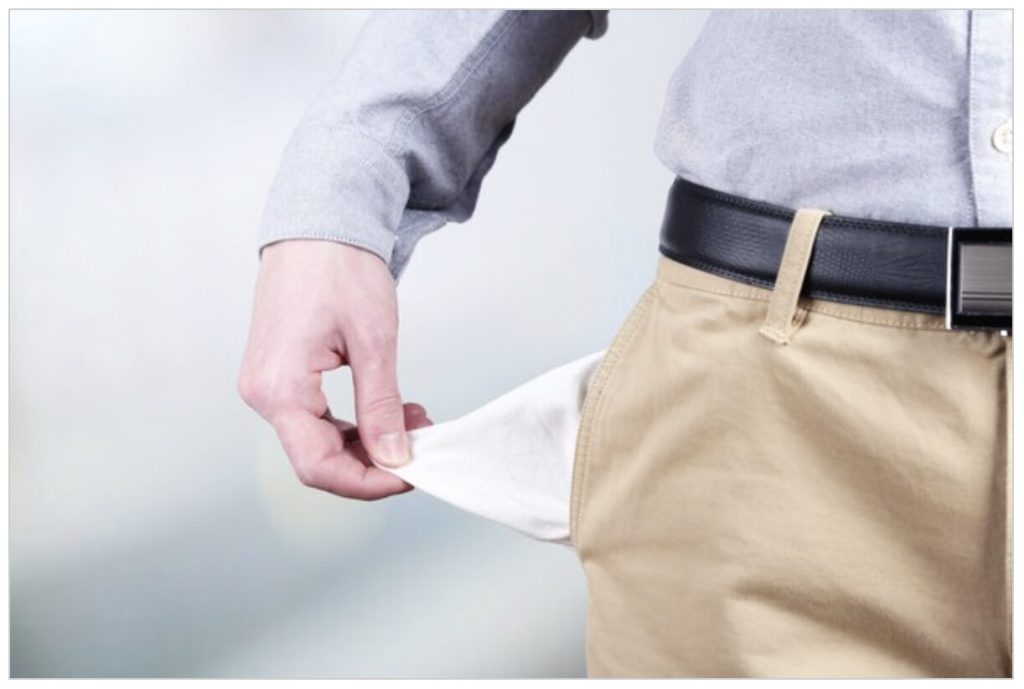
초봉 연봉 4천만 원이라고 들으면 꽤 괜찮은 편이죠. 그런데 첫 월급 명세서를 딱 받아보는 순간, 통장에 찍힌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놀라게 됩니다. 게다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는 4대보험료율과 세금 구조 변화까지 예고돼 있어서 체감 월급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연봉 3000·4000·7000 구간에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현실적인 방법도 같이 짚어볼게요.
연봉 4000, 왜 체감은 3000대일까
연봉 4000만 원이면 단순히 12로 나눠서 월급 33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전’ 금액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펼쳐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줄줄이 빠져나가요.
이 공제 항목들을 합치면 연봉 4000 기준으로 대략 월급의 10% 이상이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결국 ‘연봉 4000’이라고 적힌 계약서와 내가 실제로 쓰는 돈 사이에는 꽤 큰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2025년 연봉 3000·4000·7000 실수령액
먼저 2025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연봉 구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숫자를 한 번에 보는 게 이해가 훨씬 쉬워요.
| 연봉(세전) | 세전 월급 | 예상 월 실수령액(2025년) |
|---|---|---|
| 3,000만 원 | 약 250만 원 | 약 225만 원 |
| 4,000만 원 | 약 333만 원 | 약 294만 원 |
| 7,000만 원 | 약 583만 원 | 약 484만 원 |
표만 봐도 느낌이 오죠. 연봉 4000만 원이면 세전 월급은 333만 원인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00만 원이 안 되는 약 294만 원 수준이에요. 연봉 7000만 원은 세전 월 580만 원대인데, 실수령액은 48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액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연봉 증가 폭만큼 실수령액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봉 3000만 원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세전으로는 월 250만 원이지만, 기본 공제만 적용해도 실수령액은 225만 원대에 그칩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네”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26년엔 연봉 4000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
문제는 2025년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어서 전체 공제율이 약 0.3%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월 실수령액이 약 294만 원 수준인데, 2026년에는 약 289만 원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연봉은 그대로인데 월급에서 5만 원 정도가 사라지는 셈이라, 연간으로는 60만 원 가까운 차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거나 대출 이자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월 5만 원 차이는 꽤 크게 다가와요. 통신비 한 번 정리하거나, OTT 1~2개 해지하는 수준의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한 번에 정리
그렇다면 월급에서 정확히 뭐가 빠져나가는 걸까요. 헷갈리기 쉬운 4대보험과 세금을 표로 한 번 정리해보면 머릿속이 조금 정리됩니다.
| 공제 항목 | 대략적인 비율 | 역할 |
|---|---|---|
| 국민연금 | 월급의 약 4.5% | 노후 연금 재원,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 |
| 건강보험 | 약 3.5%대 |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 내외 | 노인요양시설·돌봄 서비스 재원 |
| 고용보험 | 약 0.9% |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연봉에 따라 약 5~20%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 |
여기에 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라서 연봉이 50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세금이 확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연봉은 꽤 올랐는데, 왜 월급은 생각보다 안 늘었지?”라는 체감이 생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구간 변화예요.
실수령액,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세금과 4대보험 인상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쉴 필요는 없어요. 구조 자체를 바꾸긴 어렵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조정해서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연말정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약 148만 원 수준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연봉 100만 원대 인상 효과’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월급이 당장 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목돈처럼 돌아오는 구조라 체감이 꽤 커요.
둘째로는 소비 습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신용카드 위주로 쓰던 사람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율이 올라가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게 식대예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연봉 40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면 과세 대상 금액은 사실상 376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연봉 숫자는 그대로인데 세금은 줄고, 실수령액은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자차 운전보조비나 일부 육아 관련 수당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들도 회사마다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급여 체계를 한 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회사 복지제도도 실수령액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예요. 복지포인트, 자기계발비, 주택자금 대출 지원, 통신비 지원 같은 항목들은 ‘현금 월급’에는 안 찍히지만, 실제 생활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연봉 4000이라도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면 체감 가처분소득은 전혀 다른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연봉 협상·이직 준비 전 체크 포인트
이직을 준비하거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숫자를 보는 순서를 살짝 바꾸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연봉이 얼마냐”보다 “2025년 기준 월 실수령액이 얼마 나오고, 2026년에는 얼마나 변할지”를 대략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저축할 수 있는 돈, 대출 상환 가능 금액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협상 자리에서는 연봉 총액만 보지 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 비과세 항목 구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비중이 높으면 연장·야근수당 계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4대보험과 세금도 더 나가요. 반대로 식대·복지포인트 같은 비과세·비현금성 복지가 잘 구성돼 있으면, 숫자상의 연봉이 약간 낮더라도 실제 생활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율과 각종 사회보험료는 계속 손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변화를 개인이 막을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고, 비과세 급여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 기록을 세금에 유리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같은 연봉인데 남는 돈은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연봉 4000만 원, 숫자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월 290만 원대라는 현실을 알게 되면, 괜히 우울해하기보다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쪽이 훨씬 생산적이에요. 오늘 정리한 구조와 대략적인 금액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내년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빗썸 역대급 신규 이벤트… 5분만에 7만원 받는법
유튜브 ‘5천원’으로 구독하는법 + 2년 써보며 알게된 장단점
아래 쿠팡 검색창에서 최저가를 직접 검색해보세요!